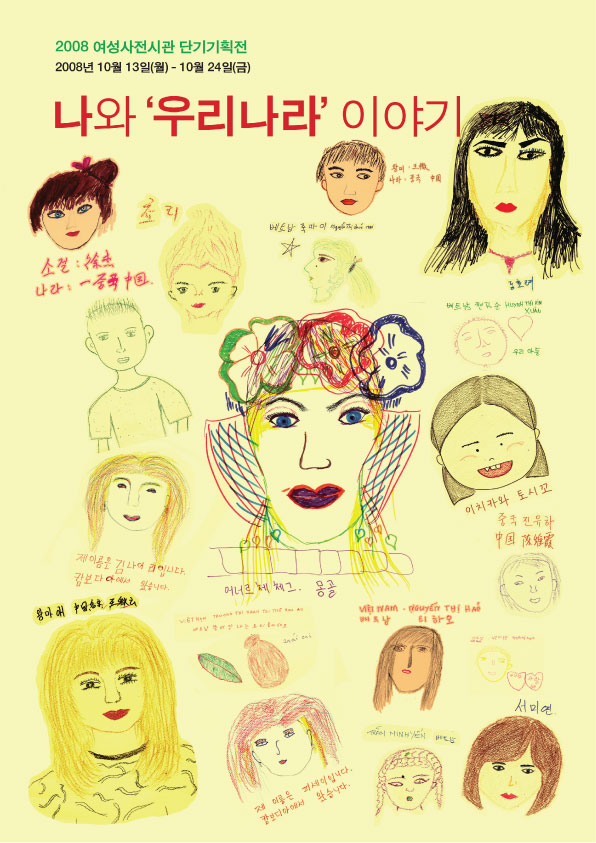*구로사와 기요시의 영화 제목 전시를 위해 그림일기 몇 장을 그려내고 있을 때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저자의 양해를 구할 것도,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것도 없어 참 좋겠네. 그런데 말이다. 10대와 20대 사이, 지난날의 본인 일기를 들추어 보고 그걸 다시 한번 옮겨 적는 일이 이렇게 부박하고 남루할지는 몰랐다. 실패한 날, 조금 더 실패한 날, 완전히 실패한 날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나의 일기장. 불운이 감수분열하는 하루하루. 우습고 조악한 나날의 표현에는 자연스럽게 콜라주가 따라오게 되었다. 그것이 감정의 파편을 돕기도, 감정의 무거움을 경량화시키기도 했다. 작업 자체가 자가진단을 통한 미술치료랄까, 거울기법이랄까. 그리고 싶은 풍경은 매번 납작하고 물기 없는 형태로만 드러나지만,..